-
퀴어 소설 2권 추천: 코리아 밀레니얼 퀴어와 아메리카 모더니즘 퀴어. <대도시의 사랑법><캐롤>책 2020. 2. 27. 23:56
도시에는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패션, 음식, 종교, 인종 ... 여러 경우의 수로 도시의 사람들은 나뉩니다. 도심 길거리, 내 옆을 걸어가는 사람, 붐비는 지하철 속 옆에 앉은 사람의 성향을 겉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성향과 취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경우엔 더욱 그렇죠. 말하기 싫은, 혹은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성적 취향이 바로 그렇습니다.

좁고 작은 곳에서 다르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내가 나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나도 너와 같다고 말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도시의 조건은 다양성입니다. 소수자에게 대도시는 나임을 드러내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뒤섞여들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 같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채우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화려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가 화려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고 빛나고 얼룩진다는 건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 어둡고 가려져 있는 곳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취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끌리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수자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퀴어라 불립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소수라로 칭해지는 퀴어들은, 나의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면 죄악시되었습니다. 오랜 외면과 따돌림의 세월을 견디던 그들이, "나도 화려한 도시에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다"며 생겨난 것이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일 년에 하루. 그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도 도시에서 빛날 자격이 있다고,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드러냅니다. 여러 색의 사람들을 품는 도시에는 퀴어를 품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있기에, 일 년에 단 하루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조차 퀴어들을 핍박하려 합니다. 핍박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던 시절을 지나, 조금씩 다양성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추천하려는 책은 퀴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책 <캐롤>과 한때 선비의 나라, 유교의 나라로 불리던 나라 한국의 밀레니얼 퀴어의 사랑을 그린 책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1. <캐롤> 원작 소설로 읽기 전
영화를 먼저 보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며 순응과 획일화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시절, 흑인민권운동이 활발하던 그 시절에 퀴어가 자신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캐롤>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관에서 3번을 봤을 정도이지요. 사실, 이 영화의 진면모는 책이 아니라 영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의 색채와 퀴어를 다루는 방식,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의 연기가 압권이지요.

오른쪽은 커버. 왼쪽은 책입니다. 양장으로 고급스럽습니다. 부드러운 벨벳 느낌이 나는군요. 영화 <캐롤>은 매니아가 생길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영화 개봉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이 양장판 한영 각본집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산 건 1판인데요. 출간되자마자 인터넷서점 알라딘 종합베스트 20위권 순위로 올라서더니, 며칠 뒤 1판이 품절되었습니다. 지금은 2판으로 표지갈이를 해서 출간되었는데, 웬일인지 평과 별점이 좋지 않네요. 작품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악용해서 돈을 벌 궁리로 이런저런 판들을 찍어내며 장난(?)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랬던 걸까요? 평은 대체로 그렇네요. <캐롤>이 좋은 건 퀴어를 다루는 섬세함 때문도 큽니다. 퀴어를 다룬 콘텐츠를 볼 때면 불편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 행위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격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 영화와 소설이 이성의 성적 행위를 다룰 때는 보드랍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왜 퀴어의 성적 행위는 포르노의 한 장면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퀴어의 사랑을 다루는 주체이면서도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퀴어의 사랑법을 포르노로 배운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편견이 여전히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런 취향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좋다는 걸 알고 펼치는 교묘한 전략인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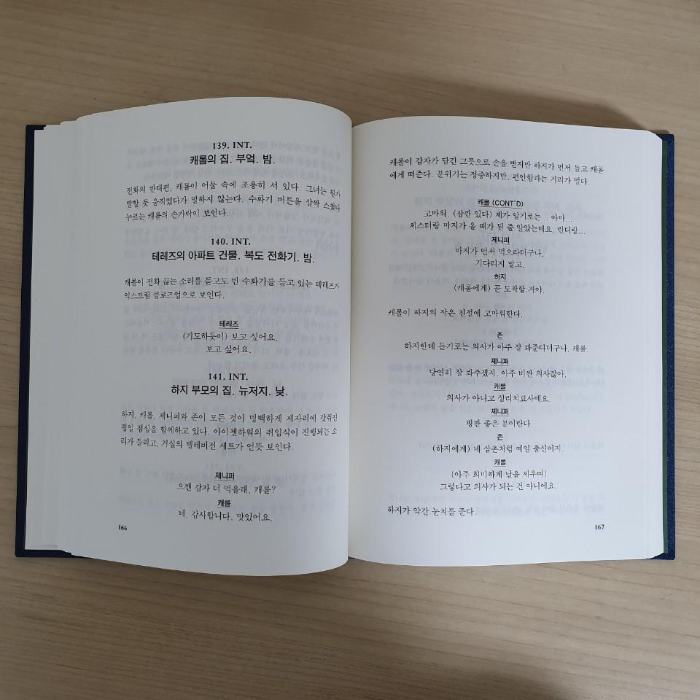
앞쪽 페이지에는 한글 번역으로 실렸습니다. 
뒤쪽에는 영문으로 실렸습니다. <캐롤>은 소설로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캐롤> 각본집을 추천합니다. <캐롤>은 소설이 원작입니다만, 영화 <캐롤>이 담고 있는 압도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영상 밖 텍스트로 고스란히 느끼기에는 원작보다 각본집이 더욱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작을 뛰어넘는 콘텐츠 재창조가 바로 영화 <캐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를 꼭 먼저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대도시의 사랑법> 보편적인 도시인의 사랑
숨어야 하는 것. 쉽사리 말하기 어려운 것. 이런 걸 말해도 되나 싶은 것. 퀴어의 사랑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이 신선하다 못해 조금은 충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 젊은작가상 대상을 받은 작품이 수록된 책 <대도시의 사랑법>. 무언가 너무나 미래적인 2020년을 앞두고 박상영 작가가 젊은작가상 대상을 받은 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양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우리에게 퀴어는 더 이상 숨어서 이야기하고 쉬쉬해야 하며 억지로 감추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사랑을 편견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없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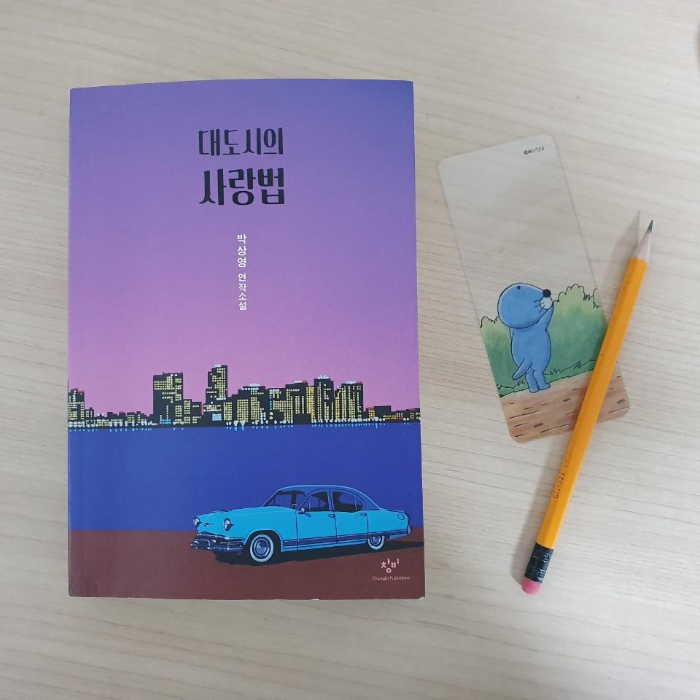
어쩌다 보니 보노보노 책갈피와 연필과 함께 사진을 찍었네요. 보노보노도 연필도 둘 다 이 책 속 내용과는 안 어울립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퀴어, 트랜스젠더 등 예전이었으면 주변 지인 몇몇 정도에게만 겨우 털어놓을 수 있던 비밀 같은 것이었던 취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튜브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의 대담한 용기가 놀라운 확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중엔 진중하고 따스한 온도로 그려지는 사랑도 있지만, 때론 경박하고 가볍고 빠르게도 보이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퀴어라서 그렇다는 것 또한 편견이겠지요. 경박하고 가볍고 빠른 사랑법은 세상 어떤 사랑이든 존재합니다. 꼭 퀴어라서가 아니라요.
2020년 밀레니얼 퀴어의 눈물과 웃음이 있는 시트콤 같은 <대도시의 사랑법>. 1950년 미국 모더니즘 퀴어의 부드럽고 따스한 색채로 가득한, 조심스럽지만 대담한 필체를 띈 한 편의 그림 같은 <캐롤>. 퀴어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더라도 다양한 사랑의 색을 품는 입문작으로 손색이 없는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른 중반, 내 마음속 우사인볼트를 깨운 책 <마흔이 되기 전에> (0) 2020.03.03 오래된 도시 바간에서 거리두는 법을 배웠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0) 2020.03.02 서른다섯, 나는 공간을 바꾼 덕분에 인생의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 공간을 바꾸자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중개합니다> (0) 2020.02.29 초보러너라면 누구나 공감 1만 배! <마라톤 1년차> (0) 2020.02.25 하루키 아저씨처럼 달리고 싶어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0) 2020.02.24